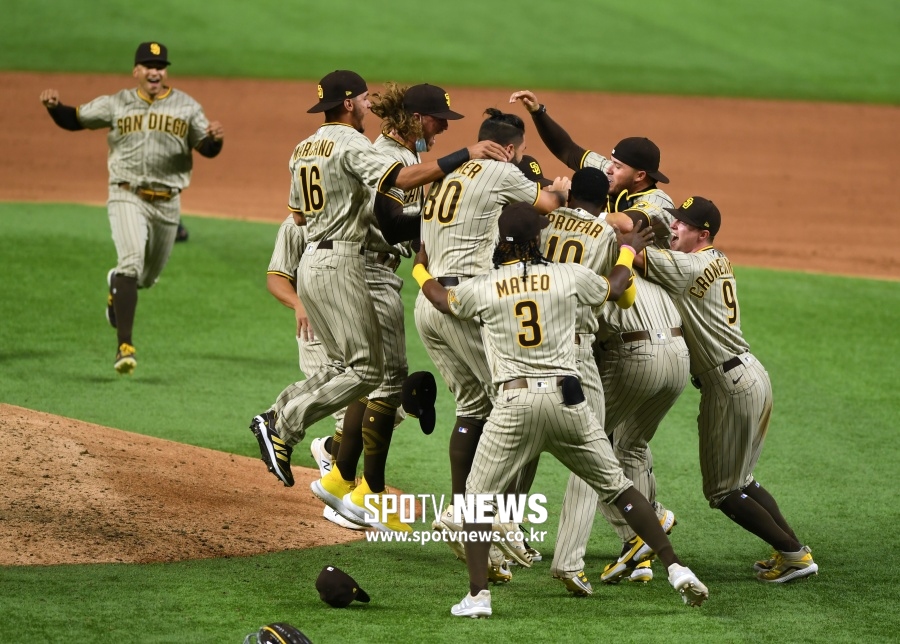
과거 투고타저 시대와는 다른 양상이다. 많은 안타보다 출루와 장타를 강조하는 경향, 늘어난 수비 시프트 등이 리그 전체의 타율을 낮췄다. 24일(한국시간)까지 메이저리그 평균 타율은 0.237이다. 지난해는 0.245였고, 2019년에는 0.252였다. 미국 디애슬레틱은 23일 메이저리그 선수와 감독에게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었다.
다저스 클레이튼 커쇼는 오히려 타자들을 걱정했다. "공에 손을 댄 결과가 어떻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홈런이 줄었다고 하지만 삼진은 그대로다. 노히터를 달성한 코리 클루버(양키스)에게는 존경을 보낸다. 그러나 이게 매일 일어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시애틀은 올해 두 차례 노히터를 '당한' 팀이다. 카일 시거는 "구속이 정말 빨라졌다. 여기에 분석은 많아도 너무 많다. 내가 야구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며 더 정교한 분석이 타자들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고 했다. 초고속 카메라를 활용한 투구 전략의 수정은 타자들의 노림수 성공률을 현저하게 떨어트렸다. 장타를 노리는 스윙을 하려다 보니 안타 확률은 상대적으로 내려간다.
메이저리그에 만연했다는 '부정투구'를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 이도 있었다. 마이애미 애덤 두발은 "파울볼을 잡았을 때 끈적이는 느낌이 들면 정말 실망스럽다. 야구장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싶은데,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유야 어쨌건 현장의 선수들은 이 변화를 안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미네소타 로코 발델리 감독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야구다"라고 말했다.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제보>swc@spotvnews.co.kr
